기사상세페이지

광주에서 태어나 2018년 《서정시학》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박인하 시인의 첫 시집 『내가 버린 애인은 울고 있을까』가 걷는사람 시인선 107번째 작품으로 출간되었다.
박인하의 시집을 펼치면 "아직 살아 있구나 늦지 않았어”라는 다정하고도 서늘한 첫 속삭임이 우리를 반긴다.
"뜨겁고 차가운 것이 이생의 일인지도”(「테를지의 밤」) 모르기에, 시인의 세계는 삶을 구성하는 잔혹하고 아름다운 생명력과 그것이 지닌 다채로운 온도로 가득하다.
의도적으로 구성된 "어느 곳으로도 건너갈 수 없”(「검은 식물」)는 "희고 빛나는 세계”(「눈물」)로 걸음을 옮기면, "땅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지 않을 때”(「보이지 않는 도시」)를 기민하게 감각하는 그의 인물들이 보인다.
이들은 외부의 규격에 자신의 모양을 맞추는 대신 "누구도 쉽게 나를 호명하지 못”(「테를지의 밤」)하도록 적극적으로 이탈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역으로 그 존재를 드러낸다.
그리하여 시인은 "손을 꼭 잡고 빛의 뒤편으로 사라져 가던 연인들”(「부러지는 빛」)의 주위로 쏟아져 내리는 빛을 감각하고, "웃을 수 있는 건 지켜보는 쪽”(「첫 번째 수업」)이라는 명제의 바깥에 남겨진 응시당하는 이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물성의 뒷면이 가진 고유함을 온전히 응시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짐작해내는 오롯한 풍경을 선사하는 것이다.
그러니 뒤돌아 도망치는 것이 끝내 부끄럽기만 한 일은 아니라고, 시인은 일러 주는 듯하다. 이곳에서만큼은 "우리 도망가자”라는 말이 더없이 달콤하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이의 마음에 녹아 있을 너른 함의와 그 내밀한 속을 겁내지 않고 가만히 들여다보는 한 시인의 마음이 이곳에 있으므로. 그러니 "그 후로 슬픔은 오래 녹지 않는 것”(「소금 기둥」)이 되어 버린다 해도 "우리”는 괜찮을 수 있는 것이다.
"많이 써 버려서 망가진 마음”을 향해 조곤조곤히 속삭이는 목소리와 "차라리 죽어 버려라 없어져 버려라”라는 격렬한 염원이 담긴 절규의 끝에는 "두려움을 잊기 위해 부르는 노래”(「검은 식물」)를 가만히 따라 불러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까닭이다.
이렇듯 찐득찐득한 밤과 죽음과 세상의 온갖 어둠으로부터, "혼자가 될 때까지 하나씩 버려지는 것들”(「리모델링」)의 바깥으로부터. 시인 박인하는 "아주 오래전에 사라져 버린 빛의 파편 속”(「시뮬레이션」)에 숨겨진 희망을 찾아낸다.
최백규 시인이 이야기하듯, "하나의 인생이 또 다른 하나의 인생을 들여다보았으므로 어느 잠에서 우리는 옷깃을 스치며 서로의 곁을 지나칠 때가 올 거라”는 희망이 이곳에 있다.
"무한 반복에도 질리지 않고 아름다울 수 있”(「블랭킷」)음을 믿는 이의 시에는 반드시 마음속 여린 부분을 건드리는 울림이 있기에, "멀리 있는 빛 속을 출렁”이고 "서로의 슬픔으로 언제나 다정”(「조용한 산책」)한 이 세계는 기어코 환하게 아름답다.
해설을 쓴 이성혁 문학평론가는 "죽음과의 대면을 집요하게 시도”하려는 시인 박인하의 작법에 주목하며, "시인이 할 일은 우리가 신의 상실에 따른 빈곤 속에 있으며, 우리의 삶이 죽음과 접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환기시키는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죽은 것들을 태우는 것이 시의 불을 살려내는 일”이라고 말하며 "그 시의 불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듯하게 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짚어낸다.
"서로에게 다가가서 부러지던 빛”의 곁에는 언제나 "거기에서 다시 돋아나는 빛”(「부러지는 빛」)이 있듯이. 이 책을 펼친다면, 어둠을 곱씹고 더듬으며 더 환한 빛을 향해 나아가는 한 편의 생에 흠뻑 빠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추천사(최백규 시인)
이 시집은 안과 바깥, 이곳과 저곳, 그때와 지금을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들을 읽고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이 멍하니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모든 일이 전생인지 이생인지 구분할 수도 없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밤이 잠들었다가 일어나는 아침과 이어지는 것이다. 나는 이 시집을 시인의 자서전이라 생각한다.
하나의 인생이 또 다른 하나의 인생을 들여다보았으므로 어느 잠에서 우리는 옷깃을 스치며 서로의 곁을 지나칠 때가 올 거라 믿는다. 그 순간 다시는 여름의 한복판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예감이 들지도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칠월이 가도 팔월이 올 것이다. 이 시인은, 시집은, 시들은 처음부터 그러한 미래를 알고 있다. 젖은 돌을 긁는 바람이 있듯이. 붉은 꽃은 다 동백이라고 읽는 이가 있듯이......
03997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6길 51 서교자이빌 304호, 도서출판: 걷는사람, 편집부: 한도연
Tel: 02-323-2602 / Fax: 02-323-2603 E-mail: walker2017@naver.com
걷는사람 시인선 107, 2024년 1월 19일 1판 1쇄 펴냄, 132면 / 값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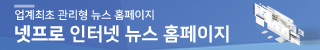
















게시물 댓글 0개